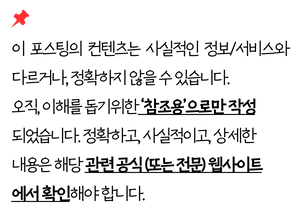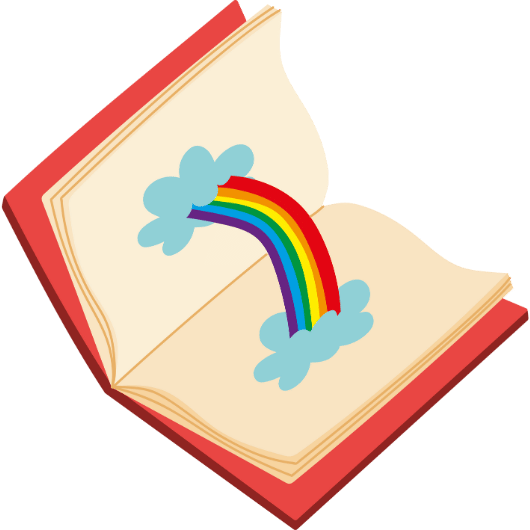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꿈의 기술? 상용화 문턱 넘으려면…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전환, 말은 좋은데 전기 요금은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것 같아 막막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 ‘차세대 태양전지’ 같은 희망적인 소식을 접하면서도, 정작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언제쯤 현실이 될지 궁금해합니다. 특히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라는 이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를 뛰어넘는 효율과 저렴한 생산 비용으로 ‘게임 체인저’라 불리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죠. 하지만 이 꿈의 기술이 우리 집 지붕에, 혹은 도심 빌딩 외벽에 자리 잡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연구실의 놀라운 기록들이 상용화라는 현실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단지 기술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 에너지와 직결된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상용화, 3가지 핵심 열쇠
깨지지 않는 견고함: 실험실 수준을 넘어 실제 환경의 수분, 산소, 열, 빛 등으로부터 효율을 지켜낼 장기적인 안정성과 내구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크고 넓게, 더 균일하게: 작은 셀(Cell)에서의 높은 효율을 넓은 면적의 모듈(Module)에서도 그대로 구현하는 대면적 생산 기술의 완성이 중요합니다.
자연을 위한 약속: 환경 문제와 인체 유해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납(Pb) 성분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친환경 기술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차세대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란 무엇인가?
페로브스카이트는 본래 러시아 과학자 레프 페로브스키의 이름을 딴 광물의 결정 구조(ABX3)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구조를 가진 유기물, 무기물, 할로겐화물 화합물이 빛을 전기로 바꾸는 광전 변환 효율이 매우 뛰어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차세대 태양전지의 핵심 소재로 떠올랐습니다.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가 모래에서 추출한 규소를 복잡하고 에너지 소모가 큰 공정을 통해 만드는 반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용액을 인쇄하듯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용액 공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제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하며, 신문을 찍어내듯 롤투롤(Roll-to-roll) 공정으로 대량 생산의 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왜 페로브스카이트에 주목하는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의 효율 한계, 즉 ‘쇼클리-콰이저 한계’를 넘어설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실리콘 태양전지는 주로 장파장 영역의 빛을 흡수하는 반면, 페로브스카이트는 단파장 빛 흡수에 강점을 보입니다. 이 둘을 결합한 ‘탠덤 태양전지’는 태양광 스펙트럼의 더 넓은 영역을 활용해 이론적으로 최대 44%까지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미 실험실 단계에서는 30%를 넘어서는 효율이 보고되고 있어, 상용화 시 에너지 혁명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구분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 실리콘 태양전지 |
| — | — | — |
| 광전 변환 효율 (이론) | 약 44% (탠덤) | 약 30% 미만 |
| 제조 공정 | 저온 용액 공정, 인쇄 방식 가능 | 고온, 고진공의 복잡한 공정 |
| 제조 비용 | 저렴 | 상대적으로 고가 |
| 형태 | 유연하고 가벼우며, 반투명 구현 가능 | 무겁고 딱딱하며, 불투명함 |
| 응용 분야 |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웨어러블 기기, 차량 선루프 등 |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위주 |
상용화의 길목에 놓인 3가지 장애물
이처럼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상용화는 왜 더딜까요? 여기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세 가지 핵심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안정성과 내구성 문제
페로브스카이트 결정 구조는 수분, 산소, 열, 빛 등 외부 환경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열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상용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힙니다. 아무리 초기 효율이 높아도 수명이 짧다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분 침투를 막기 위한 봉지 기술(캡슐화) 강화, 구조 결함을 제어하는 표면 처리(패시베이션) 기술, 그리고 수분에 강한 새로운 유기 정공수송층 물질 개발 등이 대표적입니다. 최근에는 특정 첨가제를 넣어 결정립계를 안정시키거나, 박막 내부에 쌓이는 인장응력을 해소하는 기술들이 개발되며 장기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한 연구팀은 개발한 소자가 500시간 동안 고습도 환경에서도 초기 성능의 87% 이상을 유지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둘째, 대면적화의 어려움
실험실에서 기록하는 높은 효율은 대부분 손톱보다 작은 1㎠ 미만의 셀(Cell)에서 얻어집니다. 하지만 실제 발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수백 배 이상 키운 패널(Panel) 또는 모듈(Module)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면적을 넓히는 과정에서 박막의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작은 면적에서는 스핀 코팅 방식으로 비교적 균일한 막을 만들 수 있지만, 면적이 커지면 결함이 발생하기 쉽고, 이는 전하 재결합을 유발해 효율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잉크젯 프린팅이나 슬롯-다이 코팅 같은 대면적화에 유리한 공정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들은 대면적 모듈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기록하며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셋째, 납(Pb)의 환경 문제
현재 고효율을 내는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에는 대부분 미량의 납(Pb)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은 인체에 유해한 독성 물질로, 태양전지 패널이 파손되거나 폐기될 경우 환경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납 없는(Pb-free)’ 페로브스카이트 개발이 중요한 연구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납을 주석(Sn) 등 다른 무해한 원소로 대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납 기반 소재만큼의 효율과 안정성을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접근법으로는 납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성균관대 박남규 교수 연구팀은 태양전지 내외부에 여러 겹의 방어막을 만들어 납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국내외 연구 동향과 미래 전망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은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분야 중 하나입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의 석상일 박사, 성균관대의 박남규 교수 등은 이 분야를 개척한 세계적 석학으로 꼽힙니다.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가 공인하는 최고 효율 차트에도 국내 연구진의 이름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한화큐셀)은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태양전지 상용화를 목표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니테스트, 신성이엔지, 필옵틱스 등 여러 기업들도 관련 기술 개발과 장비 국산화에 나서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국책 과제를 통해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독일, 영국 등 세계 각국도 미래 태양광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어, 앞으로의 기술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건물 외벽이나 창문에 적용하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부터, 유연성을 활용한 웨어러블 기기, 차량 선루프, 그리고 실내의 희미한 빛으로도 발전이 가능한 사물 인터넷(IoT) 센서 전원까지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상용화의 3가지 핵심 과제가 해결된다면, 머지않아 우리 삶 곳곳에서 페로브스카이트 기술이 만들어내는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